女생리휴가·男육아휴직 여전히 '그림의 떡'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당발 작성일16-07-25 10:47본문
-남성 88.9% 육아휴직 원해…그렇지만 100명 중 3명만 사용
-전문가 “출산ㆍ유아 등 공공적 측면 이해해야 답이 나올 것”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1. 직장인 금모(28ㆍ여)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고민에 빠진다. 남들보다 생리통이 심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 하지만 금 씨는 ‘생리휴가’를 쓸 엄두를 내지 못한다. 무급임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 근무 이후 생리휴가를 써 본 사람이 회사에 한 명도 없다는 말을 선배로부터 들은 뒤 팀장한테 한번 말할까하던 생각도 접었기 때문이다. 특히 팀장급에 남성들이 많다 보니 생리 이야기를 꺼내기도 망설여진다. 금 씨는 “여성 선배 중 한 분이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눈 밖에 났다는 말이 공공연한데 어떻게 생리휴가를 쓸 수 있겠냐”며 “진통제를 먹고 겨우 참고 있는데 옆에 다가와 ‘인상 좀 펴라’는 선배들만 없어도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2. 국내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안모(32) 씨는 최근 아내의 출산 후 간호를 위해 회사에 3일간의 ‘출산 휴가’를 신청했다 낭패를 겪었다. 윗선에서 ‘본인이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닌데 출산 당일도 아니고 3일씩이나 휴가를 내느냐’며 회의 석상에서 핀잔을 줬기 때문. 게다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성 차장은 “나는 아이를 낳고도 3개월 만에 돌아왔다. 유난 떨지마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안 씨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일선 회사에서부터 당연한 권리마저 뺏기고 있는 상황에 누가 공감하겠는가”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여성성(性)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리휴가’와 ‘출산휴가’ 등 가정의 재생산 기능과 연관된 직장인들의 당연한 권리들이 박탈당하고 있다.
|
18일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40대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생리가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생리휴가 사용은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제약사가 20~40대 여성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5.4%가 직장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생리휴가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회사 내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거나 적기 때문’(41.7%),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변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느낌(32.3%)’ 등을 꼽았다.
이는 남성 역시 마찬가지다.
여전히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취업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결과 남성의 88.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길 원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 남성의 2.6%에 그쳤다. 또, 90.3%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꼈다.
지난 1월 서울시가 발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성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아는 사람은 70% 이상이었지만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3%에 그쳤다. 이런 점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공기업에 다니는 최모(34) 씨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출산휴가 최대 5일(유급 3일)을 모두 사용하겠다면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최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4872명으로 2012년에 비해 2.7배 늘어났다. 과거에 비해선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게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출산을 개인적인 측면으로 치부해버리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생리→임신→출산’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재생산 활동이 갖는 공공적 측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남성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당 문제와 관련된 법률들은 대부분 처벌 대신 권고 등 강제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업의 이 같은 문제점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출처: 헤럴드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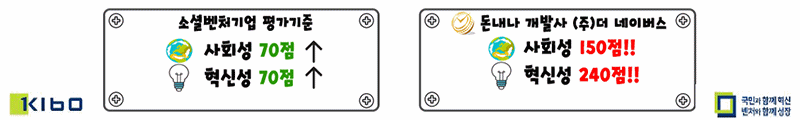


.jpg)






